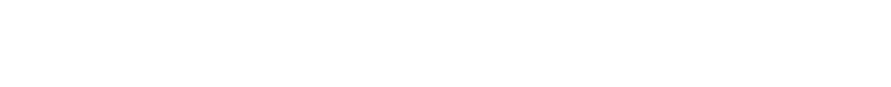정상성이라는 사회적 폭력
재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차별받거나 혐오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저는 열여섯 살 때,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세상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이상하고 남들과 다르고 그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이들을 위한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속한 곳은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있어요. 계속 이상하게 있으세요. 계속 다르게 있으세요.”
stay weird, stay different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각색상을 수상한 그레이엄 무어의 수상 소감 중 일부이다. 천재 과학자이자 게이인 앨런 튜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만든 그레이엄 무어는 게이이다. 나는 같은 성소수자로서 그의 수상이 반가웠다. 덤덤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행운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성소수자이기도 하지만 시각 장애가 있다. 다섯 살에 겪은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대부분 잃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학창 시절 내내 ‘사시’라고 놀림을 받았다. “너 어디 보는 거야? 너 사시야? 왜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봐?” 처음엔 이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났다. 남들과 다르게 사람을 쳐다본다고 놀림감 되는 것이 싫었고 화도 났다. 그렇게 울고 있으면 누군가는 계집애같이 우니까 놀림이나 당하는 거라고 또다시 내가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놀리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남들과 다른 내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줬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종종 상상해 본다.
“형, 나는 삶의 팻말이 없어”
어느 날 친한 동생인 영석이는 나에게 말했다. “형, 나는 삶의 팻말이 없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고립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속상하다고, 삶의 이정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을 리 없다.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차별과 고립을 경험할 때 반응하는 뇌 부위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와 같다고 한다. 차별과 고립을 경험할 때, 인간은 몸과 마음에서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일에 나는 ‘드랙 퀸(여장 남자)’, 그러니까 여장을 하고 노동절 집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내 몸에 닿아 박히는 시선과 마주했다. 시선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남자냐, 여자냐”며 묻기도 했다. 그게 왜 중요할까? 조금 다른 모습을 한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정체가 뭐야?’ 하고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그래도 되는 행위일까? 얼마 전 MTF 트랜스젠더(male-to female transgender)인 친구와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친구는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모습이 자신의 젠더(여성)와 일치하기 전까진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때로 나의 선택과 다수 사람들의 선택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 합리화하며 스스로 위로한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불평등을 느껴도 그냥 참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못 가진 자들의 최신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자격 미달’ 소비자들에겐, 쇼핑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삶을 나타내는 불쾌하고 역겨운 흔적이며 자신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표지다. 단순히 쾌락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적 존엄 부재의 표지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정상성을 획득하려 노력하지 않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면 좋겠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른 이가 동등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그리고 그 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 침묵할 때, 누군가가 존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자리는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고 싶다. 머물고 싶다. 자리를 가지고 싶다. 팻말을 가지고 싶다. 당신이 어떤 존재의 부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상적이지 못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불편함은 감수해야만 하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침묵한다면 누군가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삶의 팻말이 없는 사람들, 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 쭈뼛거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삭제할 때, 우아한 방식으로 혐오하고 차별하여 누군가의 삶을 벼랑으로 떠밀려 할 때, 말하지 않아도 시선으로, 행동으로, “당신과 다른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도 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무 차갑다면 우리 모두 서로가 가진 온기를 나누어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좋겠다. “이상해도 괜찮아. 별나 보여도 괜찮아. 여기 같이 있자.” 그 말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기억하며 함께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