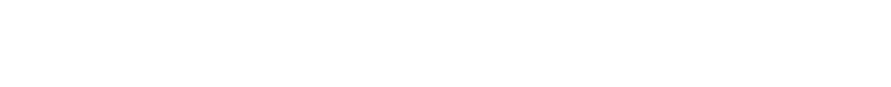조선 해양 비정규직 5만 명 해고 위기
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노동과 사회 운동의 접점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활동 중이다. / 사진 홍진훤
열흘 만에 장례를 치른 노동자가 있다. 5월 11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정 씨. 서른여덟 젊은 노동자는 세 아이의 아빠였고, 스물다섯 살에 최연소 반장이 된 A급 기술자였다. 평일과 주말 구분도 없이 매일같이 일을 나가고 반원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성실한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의 죄는 3박 4일 휴가를 다녀온 것이었다.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임시 공휴일에 캠핑을 다녀온 정씨는 5월 9일,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고 모멸감과 배신감, 상실감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은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앉아 회사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고, 열흘 후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사라져 간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2015 조선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조선 및 해양 관련 인력은 20만 4,636명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9만 5,000여 명으로 1만 명 가량 줄었다고 한다. 물량팀을 포함하면 1만 5,000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사라졌다. 2016년에는 5만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대우조선에서 폐업한 업체만 16개, 현대중공업에서는 쫓겨난 사내 하청 노동자가 7,742명이다. 연말 해양플랜트 수주가 끝나면 3만 명 이상이 공장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한다.
거제, 울산 등은 비정규직 밀집 지역이다. 2014년 기준으로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를 포함해 10여 개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13만 6,000여 명에 달한다. 조선소에서 비정규직이 쫓겨나면서 지역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거제와 울산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 밀집 지역은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다가구 주택은 전세도 나가지 않아 공실로 넘쳐 난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3%씩 오를 때 두 지역은 1% 이상 하락했다.
위기는 왜 비정규직을 향했나
2000년대 이후 조선업은 호황이었다. 전 세계 조선 주문량의 35~40% 정도를 한국이 담당했으며, 한국 수출에서 조선업 비중이 11.7%에 달한 적도 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는 주식 배당금만으로 2795억 원을 챙겼고, 언론은 역대급 ‘호황’이라 칭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위기’가 시작되었다. 2009년 이후 수주 가뭄이 지속하면서 중소형 조선 업체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빅3만이 해양플랜트 부문으로 진출하며 숨통을 유지했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하자 빅3는 채산성이 맞는 심해 석유 개발에 뛰어든 것이다. ‘물량팀’이라 불리는 일당직 노동자들이 석유 시추 작업에 투입되었다. 2011년까지 1만 5,000명 정도였던 해양플랜트 비정규직은 2014년에는 5만 2,000명 정도로 급팽창했고, 일부 공정의 직영 대 사내 하청 비율은 1:20에 달했다.
급조된 ‘물량팀’을 동원한 해양플랜트 진출은 공사 납기일 지연 및 품질 저하를 불러왔다. 회사가 직접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했으나 미숙련 작업자의 낮은 생산성도 원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고 실토할 정도였다. 이 와중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플랜트 시장은 위축되었다. 조선 3사가 2015년에 본 적자 8조 원 중 7조 원이 해양플랜트에서 난 적자다. 잠시 동안 지연시켰던 위기가 다시 찾아오자 보수 언론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최악 ‘수주 절벽’ 와중에…29일 상경 투쟁 하겠다는 현대중공업 노조”(<한국경제>, 2016.4.29.), “노조, 적자에도 ‘임금 올려 달라’…회사 문 닫기 직전까지 ‘투쟁’”(<동아일보>, 2016.5.6.). 선정적인 제목과 확인되지 않은 낱말로 채워진 기사는 정규직 노조에 총구를 겨눴다.
같은 위기, 다른 위기
5만 명. 쌍용차 정리 해고의 스무 배에 달하는 숫자가 잘려 나가고 있는데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해고라는 게 업체 폐업으로 드러나는 거라서 실제로는 구조조정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 정리 해고처럼 명단을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식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폐업과 해고를 당해 왔기에 끽소리 한번 못 해 본 채 공장을 떠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도 나서고, 대우, 삼성까지 크게 부각하는 분위기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저들의 총구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향해 있지만 당사자들은 눈앞에 닥친 총구를 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조선소 정규직 노조들은 2015년 ‘조선업종연대회의(연대회의)’를 꾸렸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9일 기자 회견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은 노동 개악 강행 시도”라며 △일방적 구조조정 즉시 중단, 부실 경영 책임자 처벌 △정부 정책 전환 △노동자 총 고용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중형 조선소 살리기 위한 정책 실시 △정부-금속노조-조선노연 즉각 업종별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연대회의가 발표한 노동자 총 고용 보장은 ▲조선소 상용직 노동자 총 고용 보장 ▲조선소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기관 설립 ▲교육 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용직이 아닌 ‘물량팀’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요구안에 담겨 있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연대회의에 참여하지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도 못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 2015년 노사 합의 과정에서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교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살자’가 회사와 정부를 향한 메시지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해 외치는 호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지금 조선소 구조조정의 실제 책임자들은 한 발짝 물러나 정규직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정규직은 정부를 탓하며 기업과 함께 살 것을 호소한다.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비정규직만이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 우리에게 이 사태가 ‘위기’인지 아닌지를 주장하는 것보다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워커스12호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