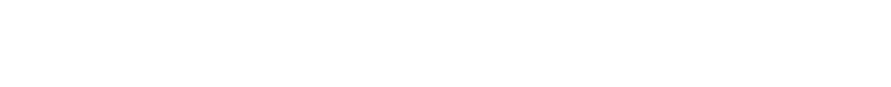200일 맞은 반올림 농성장
성지훈 기자/ 사진 홍진훤
못난 놈들이라 얼굴만 봐도 흥겨운가
강남역 한복판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농성장은 마치 ‘섬’ 같다.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출근한 직장인들의 분주한 삶들 사이에서 이 농성장만 시간이 더디 흐른다. 농성장을 둘러싼 선전물에는 비참하고 슬픈 사연들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 앉은 사연의 당사자들은 도리어 웃고 있다. 그들은 매일 밤 듣고 또 들었던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매일 부르는 노래를 또 불렀다. 농성장에서 반올림 활동가들이 진행한 ‘방진복이 빛나는 밤에(방밤)’라는 이름의 문화제는 농성장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방밤’의 DJ들은 방밤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가가 아니라 진짜 DJ로 변신한다. 매일매일 이어진 ‘이어 말하기’에는 각계 사람들이 참석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삼성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오해, 삼성의 변함없는 태도, 언론의 외면에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200일을 지냈다. 그보다는 9년 세월을 지냈다.
지난 4월 22일 열린 농성 200일 문화제에서도 연신 노랫소리가 들렸다. 봄비가 조금씩 내렸고 사람들은 눅눅하고 차가운 길바닥에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방밤의 DJ들이 재미없는 농담을 하다 사회자에게 핀잔을 들어도 사람들은 기꺼이(?) 웃어 줬다. 매주 금요일이면 농성장에서 밤을 보낸다는 대학생도 있었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 농성장을 찾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삼성에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9년간 지루하도록 반복된 이야기. 이제는 지칠 법한 긴 시간이 지났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생활고는 심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삼성. 그러나 그 길고 힘겨운 시간을 견뎌 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웃는다. 삼성의 위압적인 건물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길을 지나는 무심한 얼굴의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또 내일의 싸움을 다시 준비한다. 비닐 조각 덧대 만든 작은 농성 천막을 ‘오성급 호텔’이라 부른다. 주말 저녁에 어디 가느냐는 친구들에게 “강남역 거리에서 밤을 보낼 거”라고 말하면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을 수 있다고 농담을 한다. 세상과 삼성은 이들을 계속 외면하고 배제하지만 이들은 계속해 세상과 삼성에 말을 걸고 말을 잇는다. 그것도 흥겹게, 웃으면서. 못난 놈들은 정말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겨운 법인가.
다시 제자리
사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태는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반올림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반도체등 사업장에서의백혈병등질환발병과관련한문제해결을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내놓은 조정 권고안을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정위는 ‘공익 법인’을 설립해 직업병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 1000억 원을 삼성이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삼성이 이 권고안을 마뜩잖아한 데서 발생했다. 권고안이 나오자 조정위 권고안에 무조건 따르겠다던 삼성이 입장을 돌연 선회했다.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자체적인 보상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보상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반올림이 삼성전자 본관 앞에 농성장을 차린 건 2015년 10월 7일, 삼성 측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가 조정위에 ‘조정 보류’를 요청한 직후다.
애초에 조정위를 통한 사태 해결은 삼성이 제안했다. 삼성과 반올림의 입장 차이로 직업병 피해 보상에 대한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3자의 중재로 교섭을 진척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권고안이 나오자 말을 뒤집었다. 삼성의 보상위원회는 직업병 피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함구’를 조건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다. 9년 전 황유미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9년 넘게 지난 지금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반올림이 지나온 9년의 싸움은 헛된 일 아니었을까. 삶은 갈수록 힘겨워지는데 이들은 정말 못나서 얼굴만 봐도 흥겨울 수 있는 건가.
우리의 장기는 장기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9년이 지나는 동안, 200일의 농성 동안에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비록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였지만, 결코 꺼진 적 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전자 산업에서 발생한 질병과 죽음’이라는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결코 ‘없는 척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10년간 일했다는 한 노동자는 농성 200일 문화제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생산에 골몰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과 위험을 인지하게 하는 유일한 목소리였다고 말을 이었다.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반올림의 싸움이 시작되고 삼성은 반도체 공정에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황유미 씨보다 조금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 싸움은 꾸준히 작은 목소리로 이어졌다. 작지만 성과도 꾸준히 쌓여 왔다. 길었던 9년 싸움에서 반올림은 조금씩 이겨 왔다. 어쩌면 이 싸움을 지속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어지는 작은 승리다. 그래서 반올림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기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으면 마침내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함께 싸우던 사람들이 조금씩 떠났고 세상의 관심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사람은 지쳤고 생활은 곤궁하다. 억지 부리는 떼쟁이라는 악의에 찬 시선도 기껍지 않다. 이 와중에 여전히 비닐 천막에 앉아 추울 땐 더 춥게, 더울 땐 더 덥게 사는 이들은 정말 참 못나고 미련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 못난 사람들의 미련한 ‘이어 말하기’가 삼성과 삼성이 대변하는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왔다. 어쩌면 못나고 미련했기 때문에 이 지루하고 힘든 싸움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반올림은 200일 농성장에서 또 미련한 구호를 외쳤다. “우리의 장기는 장기전입니다.” 역시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