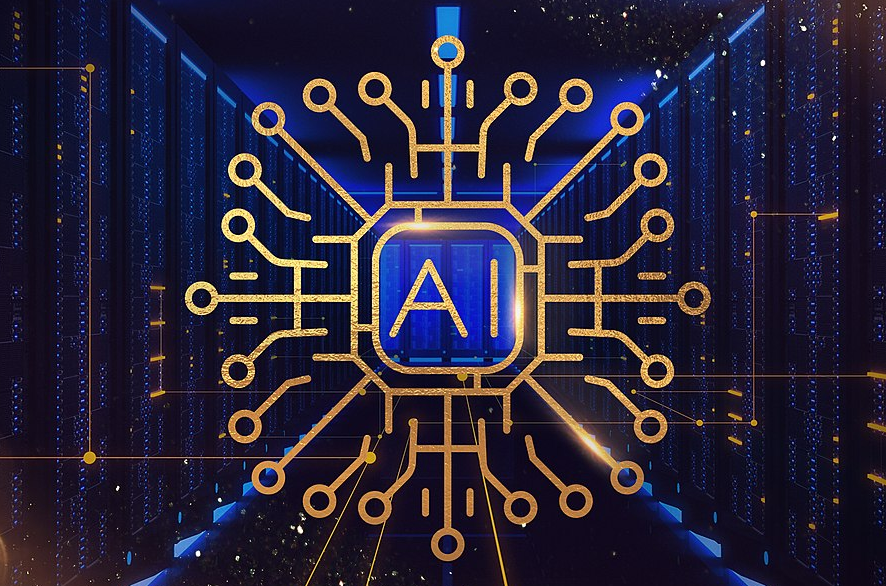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위원인 리사 쿡(Lisa Cook)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쿡이 미시간주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두 채의 주택에 대해 각각 ‘본인 거주’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두 개의 모기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쿡은 당연히 이 혐의를 부인했으며, 케인스학파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 혐의는 연준에서 즉각 해임당할 만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은 무엇일까? 트럼프와 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참모진은 연방준비제도를 장악하고 정치인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을 끝내려는 데 결심했다. 트럼프는 연준이 현재 4% 이상인 ‘정책금리’를 최소 1%까지 낮추기를 원하며, 통화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Fed 의장)을 “멍청이(numbskull)”이자 “고집불통 노새(stubborn mule)”라고 부르며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연준 직원들을 가리켜 “학자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수혜자라고 비꼬았다. 그는 “저기 있는 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 전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MAGA 지지자 중 한 명인 전 백악관 수석 고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을 연준 이사회에 앉혔고, 쿡을 교체하면 연준을 장악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 특히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베센트가 파월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 투자자들과 폴 크루그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지난 40년간 중앙은행 독립성은 주류 경제 담론의 핵심 신념이었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허친스 재정·통화정책센터(Hutchins Center for Fiscal and Monetary Policy) 소장 데이비드 웨셀(David Wessel)은 이렇게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통제하기로 결심한 것 같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이 우리의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와 전 세계의 모든 ‘독립적’ 중앙은행들이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일까? 사실 연준은 매우 비민주적인 기관이다. 미국의 가계는 누가 이사회에 임명되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그렇다면 왜 주류 경제학자, 금융 투자자, 은행, 정치인들이 중앙은행 독립성(CBI: Central Bank Independence)을 강력히 지지하는 걸까? 겉으로는, CBI는 ‘위험한 정치 세력’(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까지 포함해서)의 영향에서 벗어난 ‘중립적’ 기반을 제공하며, 통화경제학과 정책에 대해 비할 데 없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임명된다는 논리가 따른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존 코크런(John Cochrane)은 이렇게 말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숭배는 정치인들을 불신했던 시대적 지식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책임성을 가진 정치인들보다,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technocrats)를 더 신뢰했던 것이죠.”
중앙은행이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현대적 대표 사례로는 튀르키예가 자주 거론된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자신의 뜻대로 금리를 내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임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그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었다. 크루그먼은 에르도안 집권 이후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율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연간 40~5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금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만성적으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튀르키예 리라 가치를 유로와 달러 대비 끌어내렸기 때문이었을까 — 그리고 트럼프식으로 국내에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는 에르도안의 정치적 움직임도 원인이었을까? 에르도안 집권 기간 동안 튀르키예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는 GDP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앙은행 독립성(CBI)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급격히 확산됐다. CBI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일부로, 케인스식의 ‘정부가 경제를 관리한다’는 접근을 벗어나 자유시장과 특히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CBI는 “현대 경제학의 상식”(코크런)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주요 금융 기관들은 이제 CBI의 필요성을 극찬하고 있다. IMF를 예로 들어보자. IMF 전무이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는 올해 초 명확히 말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안정적인 장기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핵심적이다.” 그는 주장했다. “독립적인 중앙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이룬 성과를 생각해보라.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시기에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해 전 세계 금융 붕괴를 막고 빠른 회복을 이끌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조치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고, 경착륙 위험도 줄었다.”
게오르기에바는 IMF의 한 연구를 인용했는데,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수십 개의 중앙은행을 조사한 결과, 독립성 점수가 높은 중앙은행일수록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잘 억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다른 IMF 연구에서는 지난 100년간 17개 라틴아메리카 중앙은행을 추적하며, 의사결정의 독립성, 정책 목표의 명확성, 정부에 대한 강제 대출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역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관리 성과가 훨씬 우수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물가 안정에 중요하며, 물가 안정은 지속적인 장기 성장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시기는 본래 전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던 시기였다. 세계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1974년 정점에서 16.9%였으나 2020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세계은행은 이렇게 설명한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최저점까지 평균 0.9%포인트 급격히 하락했으며, 경제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소했다. 반대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목표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 둔화와 동반된 현상이었다.”
인플레이션 하락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시기와 겹친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은 경제 성장 둔화였다. 실제로 2010년대의 ‘긴 불황’ 동안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둔화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은행이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로 유지했지만, 오히려 물가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해서도 중앙은행들(독립 여부와 상관없이)은 인플레이션을 ‘쫓아가기만 했을 뿐’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중앙은행들이 포스트 팬데믹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주류 통화주의자나 케인스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도한 수요’나 ‘과도한 통화 공급’ 때문이 아니라 공급 측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어떤 방식으로 보든, 통화 정책은 범용 도구일 뿐이다. 수요를 빠르고 선형적이며 표적화된 방식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다른 정책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핵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에서 금리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급 요인이 수요 요인보다 더 크다.”
코크런(Cochrane)은 이렇게 요약한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가정은 너무 강해서, 시간 일관성, 독립성 등을 다룬 많은 논문들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직접 통제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낮은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는 훨씬 더 약하다. 이것이 바로 ‘끈을 밀기(pushing on a string)’ 또는 ‘돈은 엔진의 오일(money is oil)’이라는 거시경제학적 관점이다 —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멈추지만, 4쿼트 대신 8쿼트를 넣는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폭발적으로 달리게 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옹호하는 또 다른 논리는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금융·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인보다 통화 정책과 금융 규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많은 박사학위자들과 연준(Fed) 직원들의 전문성이 2008년 금융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충격과 불신 상태에 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 헨리 왁스먼(Henry Waxman)이 “다시 말해, 당신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잘못됐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가요?”라고 묻자, 그린스펀은 이렇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40년 넘게 그 이론이 예외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2007년 5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현재로서는 서브프라임 시장의 문제가 더 넓은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이나 저축기관에 심각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버냉키는 미국 금융 부문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규모를 “500억~1,000억 달러”로 추정했지만, 실제 손실 규모는 미국에서 1조 5,000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추가 1조 5,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정도면 ‘독립적인 중앙은행 전문가 집단’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결국 CB는 인플레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확산된 것이 아니라,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금융시장과 자본의 독립’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더 깊은 관련이 있었다. CBI는 금융 부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특히 좌파)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채권, 주식 등 허구적 자본(fictitious capital)과 임금 착취를 통한 이익을 방해받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을 구제해 금융 부문을 보호한 것도 ‘독립적인 연준’의 정책이었다. 코크런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연준은 2020년 구제금융 당시 재무부와 완전히 한몸이었다. 연준은 발행되는 거의 모든 신규 국채를 매입했고, 주 및 지방정부 부채를 직접 사들였으며, 엄청난 자금을 쏟아냈다. 연준이 원했다면 독립성을 내세워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재무부를 부추겼다. 연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성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대중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 금융 부문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다.”
CBI가 금융 부문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은 트럼프의 최근 연준 공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금리를 더 빨리, 더 깊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계속 오르고 있다. 낮은 금리는 차입을 통한 투기를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시장은 덜 낙관적이다.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연준이 설정하는 단기 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른바 ‘국채 수익률 곡선’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는 채권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할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CBI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와 주요 경제권에서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족이 있다고 해서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하는 연준을 트럼프식 독재로 대체하는 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주택담보대출, 대출, 저축,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다.
[출처] Should central banks be ‘independent’?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는 런던 시에서 40년 넘게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일하며, 세계 자본주의를 면밀히 관찰해 왔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