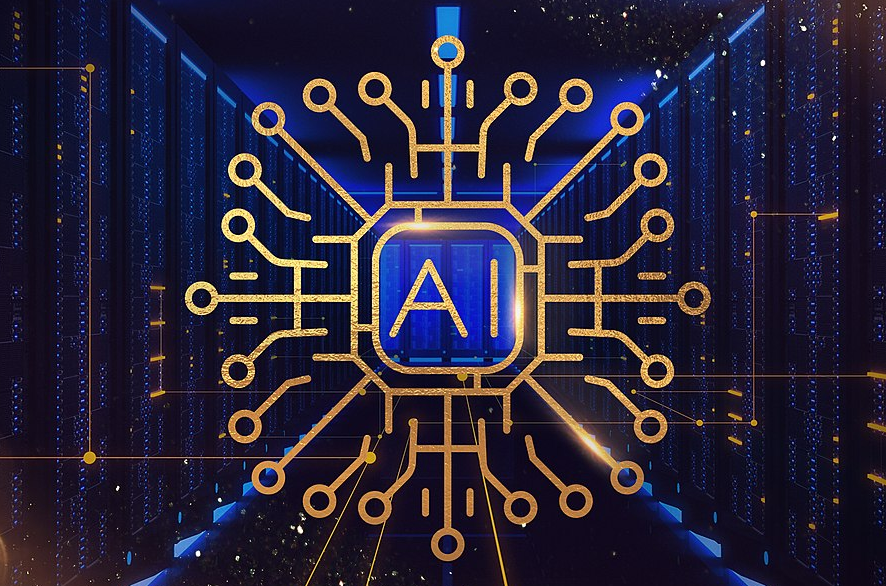왜 신자유주의는 국내적·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실패했는가?
이 질문을 나는 곧 출간할 ⟪위대한 세계적 전환: 다극 세계 속의 국가 시장 자유주의⟫(The Great Global Transformation: National Market Liberalism in a Multipolar World)에서 이 짧은 글보다 훨씬 자세히 다루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도 이 질문을 던진다.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일부가 신자유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서구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적 프로젝트였고, 이후 나 같은 동유럽인이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엘리트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의 줄지 않은 열정으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나이 든 베이비붐 세대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그들이 오래전에 사라진 세계에서 탈출해 나온 이념적 도피자처럼 보인다고 느낀다. 그들은 금성에서 온 것도, 화성에서 온 것도 아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에서 온 사람들이다.
 출처 : Unsplash+, Getty Images
출처 : Unsplash+, Getty Images
내가 신자유주의가 패배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지적 논쟁에서 패배했다거나 대체할 준비가 이미 끝난 새로운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니다. 공산주의처럼, 신자유주의는 현실에 의해 패배했다. 현실 세계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움직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매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1960년대 반항적인 세대와 이념적·세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는 비순응적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의 평등을 촉진했다. 세계화에 대한 강조를 통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 세계적 빈곤 감소를 이끌었으며, 여러 나라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심지어 악명 높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조차—그 명령문 가운데 일부가 극단적으로 적용되고 또 일부는 무시되었지만—근본적으로 건전하며 배울 만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그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지름길을 제공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한 시간도 안 되는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왜 신자유주의는 지배적 이념으로 남지 못했는가? 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것의 보편주의, 그 보편주의와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추종자들의 오만, 그리고 정부의 기만이다.
신자유주의가 보편적이거나 세계주의적이라는 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유주의 이념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대한다. 이는 장점이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원칙상 역사, 언어, 종교와 무관하게 가장 다양한 집단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동시에 그 치명적 약점이기도 하다. 그것이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는 허상은 곧 지역적 조건이 다르다는 현실과 충돌하게 된다. 지역의 조건을 신자유주의의 교리에 맞추려는 시도는 실패한다. 특히 역사와 종교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에서 지역적 조건은 매우 완고하며, 전혀 다른 지리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신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현실 세계와 맞부딪치면 신자유주의는 물러서고, 현실 세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모든 보편주의자들(공산주의자들 포함)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패배는 곧 비보편성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적 오만이 개입한다. 그들은 패배를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도덕적 결함 탓으로 돌린다. 그 신봉자들에게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수용 외에는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들이 새로이 정한 사회계약은, 비록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을지라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도덕극은 나이, 지리적 위치, 교육 덕분에 경제적 성공을 누린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경험과 결합해, 신교적 혹은 빅토리아 시대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세속적 성공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덩샤오핑이 말했듯이,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도덕적 요소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결여를 의미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만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보편주의에 충실했던 서구 상류 중산층 신자유주의자들은 동포 시민과 외국인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국내의 실패는 먼 나라의 실패보다 결코 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패배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정치의 대부분이 국내 문제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 그들의 성공의 오만은, 지역적 조건과 관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모든 이념과 종교가 공유하는 보편주의에 의해 강화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사고에는 절충주의(syncretism)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만이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스스로 자부하던 “규칙 기반의 세계질서(rules-based global order)”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실상은 여전히 국가 이익이라는 낡은 원칙을 따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중잣대의 인상을 심어주었다. 서구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이런 행태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행동과 뻔히 모순되는 선언들을 계속 반복했다. 그 결과 국제 무대에서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단어를 조작하고, 개념을 재발명하며, 현실을 조작했다. 이러한 기만의 일부는 국내적으로도 나타났다. 사람들은 통계가 그들의 불만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관적 견해가 틀렸다고, 그러니 입을 다물라고 강요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나는 그것을 ⟪위대한 세계적 전환⟫에서 다루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한 가지는 있다. 지난 50년 동안 두 개의 보편주의 이념, 즉 공산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연이어 몰락했다는 점이다. 둘 다 현실 세계에 의해 패배했다. 앞으로의 새로운 이념들은 보편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특수주의적이며, 지리적·정치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질 것이다. 자신들의 통치 영역을 보편적 원칙으로 만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의 세계적 이념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이념들은 본질적으로 지역적이며, 권력과 현상 유지의 보존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국주의적 유혹에 면역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유혹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는 없으며, 다양한 권위주의 체제들이 이를 위해 협력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들이 보편적 원칙을 결여한 이상,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권위주의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우 협소한 원칙, 즉 내정 불간섭과 공격의 부재라는 기본적 규칙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근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 시진핑이 제시한 다섯 가지 협소한 원칙은 바로 이러한 계산에 기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처] Defeated by reality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경제정의 문제를 연구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LIS)의 선임 학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의 객원석좌교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