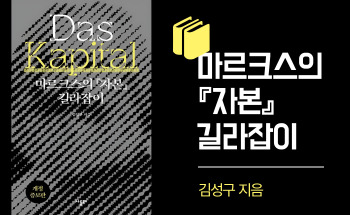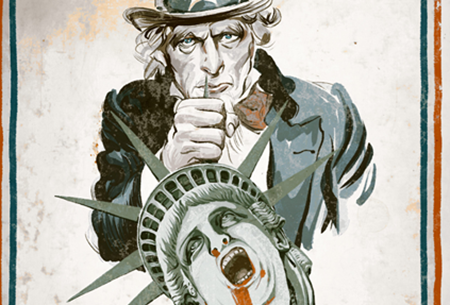그림 01 이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에 따르면, 은하단 CL0024+17 중심을 둘러싼 거대한 암흑물질 고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출처: NASA, ESA, M. J. Jee & H. Ford 외 (존스홉킨스대학교), CC BY.
그림 01 이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에 따르면, 은하단 CL0024+17 중심을 둘러싼 거대한 암흑물질 고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출처: NASA, ESA, M. J. Jee & H. Ford 외 (존스홉킨스대학교), CC BY.
현재 우주를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론 모형은 ΛCDM(람다 콜드 다크 매터, Λ는 ‘완전히 일정하지 않은 우주상수’를 의미함) 모형이다. 이 이론에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어두운' 요소 없이도 우주를 설명하려는 새로운 우주론 모델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고전적 우주 모형
ΛCDM은 표준 모형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이 모델은 실험적으로 관측된 거의 모든 현상을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한다. 특히, 우주배경복사(CMB)로 알려진 전자기 복사 형태를 설명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모델은 은하와 은하단의 분포뿐 아니라 우주에서 관측되는 수소, 헬륨, 리튬의 존재 비율도 잘 설명한다.
표준 모형은 암흑물질의 존재를 전제로 발전해 왔다. 암흑물질도 물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원자나 입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입자를 찾기 위해 여러 실험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어떤 실험도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암흑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은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빅뱅 이후
ΛCDM 모형에 따르면, 빅뱅 이후 우주는 급격한 팽창을 겪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밀도가 요동쳤고, 그 결과 광자와 입자가 혼재된 플라즈마 상태의 혼합물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주의 팽창이 시작되었다.
이 밀도 요동은 물질과 복사의 밀도에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 전자와 바리온이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수소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 플라즈마가 중성이 되면서, 요동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었다. 이때 남은 요동이 바로 음향진동(BAO, Baryon Acoustic Oscillation)이다. 이 진동은 광자, 바리온,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주로 생성했다고 모델은 설명한다.
이 음향진동은 실험적으로 관측되었으며, 우주배경복사에 각인된 우주 초기에 발생한 파동의 흔적으로 간주된다.
암흑시대
이 시기의 우주는 대부분의 전자기파 영역에서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 동안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중력 붕괴가 시작되었고, 이는 별과 같은 최초의 복사원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중력의 영향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융합되며, 우리가 알 수 없고 관측할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 밀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거대망을 형성했다. 이 정체불명의 물질이 바로 암흑물질이다.
시간이 흐르며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ΛCDM 모형에서는 암흑에너지로 불리는 음의 압력이 중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암흑에너지의 작용으로 인해 우주의 팽창은 점점 더 가속되었다.
이 모든 설명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전제로 완성된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두 요소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암흑 요소 없이도 우주를 설명하려는 대안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대안적 모델
그 중 하나가 CCC+TL 모형이다. CCC는 공변 결합 상수(Constant Coupling Covariant), TL은 피로한 빛(Tired Light)을 의미한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라젠드라 굽타(Rajendra Gupta)가 주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The Astrophysical Journal》에 발표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Λ(암흑에너지로 간주되는 우주상수)를 암흑에너지로 보지 않는다. 대신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공변 결합 상수’의 집합으로 대체한다. 이는 물리 법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우주의 가속 팽창은 암흑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결합 상수들이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는 더 역동적이고 적응적인 설명이다.
‘피로한 빛’ 개념의 추가
이 모델은 ‘피로한 빛’ 개념과도 결합된다. 아인슈타인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광자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에너지를 잃는다고 가정했다.
이 개념은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의 적색편이를 설명하는 데 쓰인다. 광자는 우주를 이동하면서 점차 에너지를 잃는다. 이로 인해 허블의 법칙으로 알려진 거리-적색편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또한 표준 모형처럼 대규모 음향진동, 은하의 크기, BAO에 의해 형성된 지평선의 각도 분포 및 우주배경복사에 각인된 구조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없이
CCC+TL 모형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생각했던 자연 법칙들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먼 은하의 빛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에너지를 잃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설명에는 암흑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표준 모형에서는 암흑물질이 질량들을 서로 묶어 은하와 은하단이 형성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우주가 팽창해도 이 구조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CCC+TL 모형은 암흑물질을 호출하지 않고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 대신 특정 스케일에서 중력 법칙에 수정을 가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대신 새로운 중력 이론을 제안하는 셈이다.
이러한 수정된 중력 이론은 은하 회전 곡선이나 대규모 우주 구조의 분포 등, 기존에는 암흑물질로 설명되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우주의 나이를 통해 본 모델의 차이
ΛCDM 모형은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한다. 반면 CCC+TL 모형은 이를 267억 년으로 본다.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의 최근 관측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초기 우주에서 어떻게 은하가 생겨났고, 어떻게 수십억 년 후의 은하만큼 발달할 수 있었는가?
CCC+TL 모형은 여기에 명확한 답을 제공한다. 우주의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원시 은하들이 형성되고 진화할 시간도 충분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원시 은하들의 구조는 오늘날의 오래된 은하들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측정한 구상성단의 나이는 《American Journal of Astronomy and Astrophysics》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CCC+TL 모형에서 제시한 우주의 나이와 일치한다.
 유클리드는 오리온자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시에 78(Messier 78) 성운의 짙은 먼지와 가스를 뚫고 관측하여, 가스로 둘러싸인 젊고 뜨거운 별들과 성간 먼지의 어두운 필라멘트로 얽혀 있는 모습을 밝혀냈다. 출처: Euclid Messier
유클리드는 오리온자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시에 78(Messier 78) 성운의 짙은 먼지와 가스를 뚫고 관측하여, 가스로 둘러싸인 젊고 뜨거운 별들과 성간 먼지의 어두운 필라멘트로 얽혀 있는 모습을 밝혀냈다. 출처: Euclid Messier
유클리드 위성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향후 6년간 유럽우주국(ESA)의 유클리드 위성은 우주 반지름 100억 광년 이내에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 형태, 거리, 운동을 관측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 이 과정을 통해 암흑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그때까지, 과연 어떤 모델이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이론 모델의 민주적 원칙은 이렇다. 실험이나 관측이 반박하기 전까지는 어떤 모델이든 옳을 수 있다.
[출처] Cómo es posible el universo con materia oscura y sin materia oscura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
펠릭스 요렌테 데 안드레스(Félix Llorente de Andrés)는 우주생물학센터(Centro de Astrobiología, INTA-CSIC) 연구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