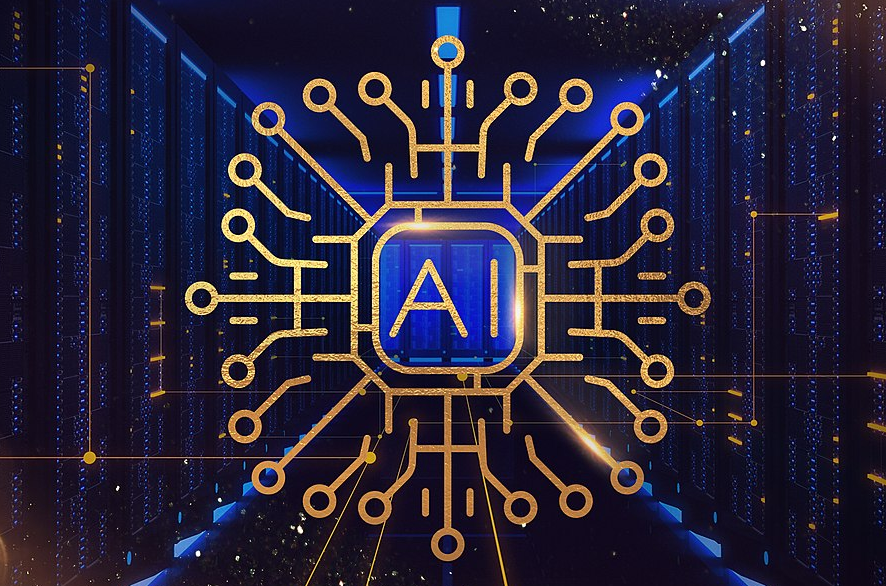오늘날 플레눔은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달리보르 페트로비치(Dalibor Petrović, 베오그라드대학교 교수이자 사회학자)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 격변의 순간마다 사회가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조직화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제도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C.L.R. 제임스(C.L.R. James)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정서’라고 불렀던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민주적 제도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구역 의회(sectional assemblies)’의 형태로, 아이티 혁명의 전성기에는 ‘민중의 기관’으로, 러시아 혁명의 초기에는 ‘소비에트’로, 스페인 혁명 시기에는 ‘인민위원회’의 형태로 등장했다.
오늘날 저항적 창의성은 전 세계 사회운동들이 부정의에 맞서 싸울 때마다 제도적 형태로 드러난다. 발칸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른바 ‘유고슬라비아 이후 공간’에서는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한 풀뿌리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플레눔(plenum)이다. 오늘날 플레눔은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지역 사회운동의 상상 속에서 플레눔은 민중의 참여에 열려 있는 민주적 회의체의 형태를 뜻한다. 언론인 네만야 루예비치(Nemanja Rujevic)는 이 라틴어 용어가 본질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모든 구성원의 참석”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시위대에게 이는 곧,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사회 전반의 방향이 가능한 한 다수에 의해, 혹은 최소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플레눔은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지향을 나타낸다. 유고슬라비아 이후 공간의 사회운동들은 과거의 공유된 역사와 언어적 유사성 덕분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떠오르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점을 국경을 넘어 전파해왔다. 플레눔의 풀뿌리적 실천은 옛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이 자율성을 위해 벌이는 투쟁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고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다.
플레눔이 처음으로 대중적인 형태로 등장한 대표적 사례는 2008~2009년 크로아티아의 대학생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무상, 즉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고등교육을 요구하며 일어났다. 이 시기 동안 학생들은 전국 20곳 이상의 대학을 점거했고, 기존 학생회 같은 대표 기구를 버리고 플레눔과 워킹그룹을 통해 점거와 행동을 조직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학생들이 이 의사결정 구조를 사회 전체에 개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투쟁은 교육이라는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의 역동성은 약화되었지만, 이후에도 (아래에서 보듯) 이 지역 전체에 직접 민주주의의 강력한 유산을 남겼다.
 그림 02 2016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학교 철학부 건물 앞에 모인 학생 플레눔. 출처: 유리차 갈로이치(Jurica Galoic) / 픽셀(Pixsell)
그림 02 2016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학교 철학부 건물 앞에 모인 학생 플레눔. 출처: 유리차 갈로이치(Jurica Galoic) / 픽셀(Pixsell)
2014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대중 봉기가 일어났다. 이는 광범위한 부패와 악화되는 경제 상황, 특히 공장 민영화와 대규모 해고 사태가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지배 계급에 저항했다. 주요 도시에서 정부 건물을 불태운 보스니아 시민들은 플레눔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시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국은 이 대중 봉기와 그 안에 담긴 민주적 내용을 무력으로 억누를 수 없었고, 결국 지방 자치단체들은 대중의 수많은 요구—민영화 재검토, 정치인의 과도한 혜택 폐지, 여러 사회적 요구 등—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플레눔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열린 민중 총회(플레눔). 출처: 데모틱스(Demotix) / 오로르 벨로(Aurore Belo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열린 민중 총회(플레눔). 출처: 데모틱스(Demotix) / 오로르 벨로(Aurore Belot)
오늘날 세르비아에서는 지배 엘리트의 탐욕과 처벌 없는 부패에 맞서 대규모 사회운동이 일어났다. 2024년 11월 노비사드(Novi Sad)에서 새로 개축된 기차역 캐노피가 무너지면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촉발점이었다. 이에 분노한 대중은 전국적으로 거리로 나섰고, 그 중심에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특히 이 학생운동은 부패를 양산하는 대의제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플레눔 제도를 제시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플레눔을 통해 수평적으로 시위를 조직했고, 사회 전체에 이 민주주의 요소를 실천이자 이상으로 채택할 것을 호소했다. 이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운동은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발칸과 그 너머의 공적 담론 중심에 올려놓았다.
 베오그라드에서 진행 중인 시위 현장의 현수막: “모두 플레눔으로 – 완전한 자치로”
베오그라드에서 진행 중인 시위 현장의 현수막: “모두 플레눔으로 – 완전한 자치로”
마지막으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도 전형적인 과두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패에 분노한 대중이 봉기했다. 그 비극적인 계기는 코차니(Kočani)에서 운영 허가가 불분명한 나이트클럽에 발생한 화재였다. 이 사건은 59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도 이윤을 우선시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꼈고, 전국의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들 가운데 플레눔에 기반한 사회적 자기조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학생 플레눔(Student Plenum)”과 같은 이름의 단체가 결성되었고, 수도 스코페(Skopje)에서는 대중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북마케도니아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Promeni.mk라는 비공식 단체의 성명이다. 이 단체는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시위를 옹호하며 정치적 대표를 거부하고, 대신 민중 스스로의 행동을 요구한다.
“불의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건 이제 그만이다! 마케도니아는 부패, 무능,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조직된 저항의 부재는 충격적이다 —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서기만을 기다리지 말자. 변화를 이끌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2015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 위치한 성 치릴로와 메토디오스 대학교(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점거 당시 열린 학생 플레눔.
2015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 위치한 성 치릴로와 메토디오스 대학교(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점거 당시 열린 학생 플레눔.
이 모든 사례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열망이 유고슬라비아 이후 공간의 사회운동과 봉기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시위대는 공적 담론의 전면에 플레눔이라는 풀뿌리 제도를 끌어올렸고, 이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로 제시했다. 남은 질문은, 과연 플레눔이 사회적 봉기의 전성기를 넘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아래로부터 새로운 조직 모델을 만들어 현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지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플레눔 제도가 끊임없이 공적 논의와 실천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슬로베니아의 마리보르(Maribor)에서 풀뿌리 운동이 지난 10년 이상 도심 10개 구역에 걸쳐 시민 회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다.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띨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서 행동에 나서도록 영감을 준다.
<참고자료>
[1] Rujević, Nemanja. “차치족은 플레눔을 원하지 않는다 (The Ćaci Do Not Want a Plenum).” Vreme, March 5, 2025. https://vreme.com/en/vesti/caci-nece-plenum/
[2] Susan Craig (ed.): 현대 카리브해: 사회학 독본 (Contemporary Caribbean: A Sociological Reader) (Maracas: The College Press, 1981), 23.
[3] Albert Soboul: 상스쿨로트: 민중운동과 혁명 정부, 1793–1794 (The Sans Culottes: The Popular Movement and Revolutionary Government, 1793–1794) (New York: Doubleday & Co., 1972), 95.
[4] Sudhir Hazareesingh: 흑인 스파르타쿠스: 투생 루베르튀르의 서사적 삶 (Black Spartacus: The Epic Life of Toussaint Louverture) (London: Penguin Books, 2021), p147.
[5] Suzi Weissman: “러시아 혁명과 노동자 민주주의 (The Russian Revolution and Workers Democracy)” in Against the Current, No. 188, May/June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newspape/atc/4975.html]
[6] Gaston Leval: 스페인 혁명 속 집단체들: 내전 중 혁명적 스페인의 노동자 자치 농업, 산업, 공공서비스에 대한 상세 보고 (Collectives in the Spanish Revolution) (London: Freedom Press, 1975). [available online at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gaston-leval-collectives-in-the-spanish-revolution#toc22]
[7] Horvat, Srećko, and Igor Štiks. “새로운 발칸의 봉기: 시위에서 플레눔까지, 그리고 그 너머 (The New Balkan Revolts: From Protests to Plenums, and Beyond)” openDemocracy, March 12, 2014. https://www.opendemocracy.net/en/can-europe-make-it/new-balkan-revolts-from-protests-to-plenums-and-beyond/
[8]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플레눔, 권력, 정치 (Bosnia and Herzegovina: Plenums, Power, Politics)” January 28, 2014.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32246
[9] Mašina. “세르비아 전역의 학생들, 베오그라드로 향하다: ‘나라 구석구석이 하나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Students from All Over Serbia on Their Way to Belgrade: ‘Every Corner of the Country Echoes with One Voice’)” LeftEast, March 14, 2025. https://lefteast.org/students-from-all-over-serbia-on-their-way-to-belgrade-every-corner-of-the-country-echoes-with-one-voice/
[10]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모두 플레눔으로!: 북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된 자기 조직화 (‘Everyone to the Plenum!’: The Beginning of Self-Organisation in North Macedonia)” Accessed March 23, 2025.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74112
[11] IMZ Maribor (Iniciativa Mestni Zbor) and Alexandria Shaner. “IMZ: 시민 총회 10년의 역사 (IMZ: 10 Years of Citizens’ Assemblies)” ZNetwork, December 5, 2022. https://znetwork.org/znetarticle/imz-10-years-of-citizens-assemblies/
[출처] Plenums in the post-Yugoslav space - Transnational Institute of Social Ecology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
야보르 타린스키(Yavor Tarinski)는 그리스의 저널리스트다. 직접 민주주의, 사회 및 개인의 자율성, 연대, 생태, 신자유주의, 관료주의에 관한 수준 높은 저서, 기사, 블로그를 다수 집필했으며 지역, 국가, 초국적 직접 민주주의 및 생태 운동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TRISE(Transnational Institute of Social Ecology)는 유럽기반 사회생태학 연구단체로 저자 소속 단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