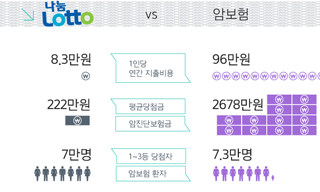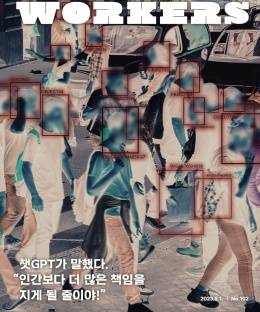|
전태일 열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난 4일 청계천을 찾았다. 전태일 거리에는 전태일 동상과 4,000여개의 동판이 있었다. 도로로 덮여있던 청계천은 이끼를 머금고 흐르고 있고, 퀵서비스, 지게를 이용해 짐을 옮기는 사람들, 커피와 차 그리고 식사를 분주히 나르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전태일 거리를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태일 열사의 동상과 동판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가고 있었다.
“도둑질 안 하면, 돈을 어떻게 갚아”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인 청계천은 더 이상 산업화의 상징이 아니다.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옷 가게가 즐비한 거리로 기억될 뿐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의류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전태일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동대문 종합시장에는 직물과 의류 부자재를 판매하는 상가가 있다. 상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물건을 주문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었다.
B직물의 이모씨(64세)는 “이 곳에 절반은 문들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이후 도저히 경기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30대의 젊은 사장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녀는 “그 중에는 박사도 있어. 취직이 안 되니 창업을 하지만, 2~3년도 안돼서 창업자금 깨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라고 젊은 사장님들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 헛소리야. 대통령이 밥 먹여주나. 규제 푼다고 해결이 되냐고. 젊은 친구들이 대출받으면 뭐 해. 갚을 길이 없는데.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 돈을 어떻게 갚아”라고.
 |
이 같은 이야기는 의류 부자재 공급을 하고 있는 이모씨(32세)에게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면 서도 그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강부자만을 위한 것 아니에요? 서민 대책은 없는 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죠. 종부세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뉴스를 보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6개월 됐는데 예방접종 3개를 맞추는 데 30만원이 들더라고요. 이러니 부모님께 명절 때만 체면치레로 몇 십만 원 드리는 게 전부라 속상하죠”라고 말을 이었다.
구조조정으로 얼마 안 남은 피복공장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피복공장이 청계 주변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김정호 서울의류노동조합 위원장에 설명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절 중국, 베트남 등과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청계 주변에 있던 의류공장이 92,3년에 대부분 이전을 했다는 것. 그 전까지만 해도 청계 주변의 상점들은 공장을 한두 개 정도를 운영했던 곳으로 상점 주인이 의류공장의 사장들이었다고 한다. 현재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 80%이상은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92년 이후 명품 브랜드 정도만 숙련공들만 할 수 있는 공정만 한국에 남겨두었다고 한다. 공장은 장안동, 문안동, 신사동 등지에 흩어져 있고, 노동자들 대부분은 하청이거나 특수고용형태라고.
92년 전까지만 해도 청계피복노조만 조합원 천명이 넘었지만, 현재 서울의류노조의 조합원은 5백 명을 넘지 못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두 곳이 전부이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비밀 조합원으로 해고 등에 대비해 가입한 것이라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호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92,3년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결국 다수의 노동자가 떠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령화됐거나, 이주노동자들이어서 조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서울의류노조 사무실은 청계천 옆 동대문상가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노조 사무실은 82년 경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 구입을 한 것이라고 한다. 김정호 위원장은 “청계 주변에 조합원이 없기는 하지만, 전태일 열사와 청계피복노조의 역사가 남아있는 노조사무실을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류노조는 98년에 청계피복노조와 북부·남부피복 노동조합과 통합해 현재의 서울의류노조를 결성했고,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두 달 뒤인 70년 12월 27일에 설립됐다.
“체념하지 말고 용기 내요”
김정호 위원장의 소개로 장안동에 위치한 피복공장을 방문했다. 미싱사인 김미화 씨는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 손목과 어깨가 많이 상했어요”라면서도 “가진 기술로 돈을 벌 수 있어 다행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 기술 배울 때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었다. 최은숙 씨는 “부부 모두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제일 속상해요”고 말하자 그녀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전성용 씨가 “(아내를)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보는 게 좋은데”라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전성용 씨는 “객공(특수고용)이었지만, 노조 가입 후 정규직이 되었죠”라면서 “월급과 근무시간이 안정적으로 변한 게 가장 좋아”라고 말했다. 노조 가입 전에는 물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14시간 일하기도 했지만, 물량이 없을 때는 출근을 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비슷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
 |
장안동의 피복공장을 나오는 길.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청계 주변과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도, 전태일 열사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38년이 흐르는 동안 청계천도 변하고 산업구조도 변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단지 전태일 열사가 있었던 곳에는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장안동 피복공장을 나서며 들은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기로 했다. 전성용 씨에게 전국노동자대회와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이해 한 마디 부탁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그 때보다 살기가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내서 노조를 가입하면서 일하기 좋아졌어요. (피복공장 노동자들이) 나이가 많아 체념하시는 데, 용기내서 나섰으면 좋겠어요”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