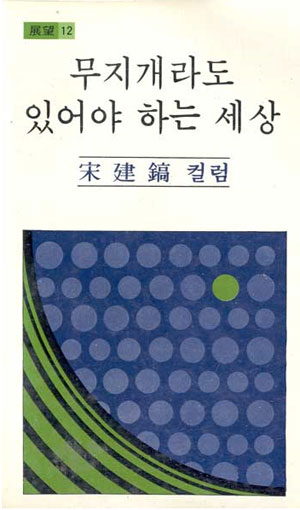 |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송건호의 생각을 들여다 본다. 10대 후반까지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받은 식민지 지식인의 사고체계를 엿보고 싶었다. 송건호의 한계를 알아야 똑바로 볼 수 있다. 조심스러움과 애정을 담아서 시작해본다.
예나 지금이나 관료들의 황당한 머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책의 앞 부분 <술 주정꾼>이란 제목엔 “서울 시경이 주정꾼의 취중 횡설수설을 녹음하고 취태를 촬영해서 본인에게 들려주고 보인다는 안은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있다. 군사정부의 초기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으리라 생각해도 우습기 그지없다. 송건호 선생은 언론인이라면 으레 마시던 ‘말술’이 아니었다.
<어린이 속어>에선 당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가 섬짓하게 드러난다. 어린이 속어에는 성인사회의 부패가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시내에 꽤 오래전부터 ‘와차’라는 말이 유행되어 있다. ‘와이로를 먹고 차별 대우하는’ 학교 풍경을 그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 순진무구한 동심에 비친 학원 부패상의 한 토막”이라고 씁쓰레 한다. 부패한 교육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한 해 자살자가 1만명을 넘지만 60년대 초엔 어땠을까. <자살의 유행>은 “61년 서울 시내 자살자 수가 757명인데 해마다 자살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저자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불안’에서 찾는다. 4.19와 5.16를 원인으로 짚었다. 이어지는 <자살의 기사>는 자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문이 자살 사건을 다루는 태도는 소홀한 감이 있다. 광주에서 최 노인이 생김치를 주지 않았다고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고 철도 자살을 했다”는 한 지방신문 기사를 지적했다. 저자의 지적에도 이런 류의 보도태도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 법석댄다”는 저자의 지적은 여전히 정당하다.
아쉬운 점도 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의 장벽을 이해하더라도 지식인 특유의 한계가 보인다.
<군령과 기합>은 일제 말기 ‘프리데릭 대왕’이라는 나치 독일의 선전 영화를 보고 느낀 걸 적었다. 독일군의 한 병사가 이웃 부대로 연락 임무를 띠고 가다가 적군을 발견한다. 한참 생각 끝에 본대로 돌아와 그 사실을 알려 기습공격으로 대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병사는 연락 임무를 어겼다며 영창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위로 특진한다. 저자는 “영화관을 나오며 몹시 감격했다”고 틀어놓았다. 나치 칭송하는 영화보고 감격하는 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당시 한 두 건씩 생겨난 <국제 결혼>을 보고는 “가난한 나라(한국)의 호주머니 돈이 터번(아랍인)이나 왕서방(중국인) 아내가 되라고 지출되기에는 아직 아깝다”고 말한다.
냉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그늘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려했던 <제3세력> 나라들을 향해선 “양쪽에서 원조를 많이 얻자는 타산에서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도 같다. 알제리가 그렇고, 라오스가 그렇고, 요즘의 예멘 쿠데타 세력이 그런 것 같다. 꿩 먹고 알 먹자는 주의라고나 할까”라고 혹평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