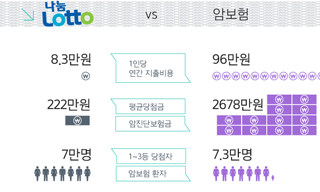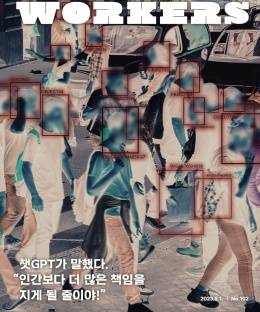|
▲ 지난해 12월 5일 공공연구노조 소속 해고노동자는 복직을 요구하는며 천막 농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노동당] |
앞서 정상철 조합원은 2001년 2월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에 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주화 저지 총파업을 벌이다 해고됐다. 강용준 조합원은 2009년 11월 당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연대 활동을 벌이다 해고를 당했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희생자구제기금을 운영 하고 있다. 노조 규약 제15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는 “노조는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월 2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3인 중 2인(강용준, 정상철)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중단 및 제한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2월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을 통해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구제기금을 통해 연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희생자의 조건, 처지를 따지고 구제기금을 제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생계비 지급을 중단·제한한 이유는 ‘해고자가 조직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노조가 ‘독자 투쟁’이라고 본 것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행정동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진행한 천막농성,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이다.
노조는 당시 한국과학기술원 측과 구체적인 복직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천막농성 투쟁이 교섭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이었다.
해고자들은 지난 1월 7일 농성을 잠정 중단하며 노조 측에 희생자 구제 관련 논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희생자 복직 투쟁과 활동 점검의 건’을 상정했고, 중집은 이 안건을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으로 변경해 중앙위에 올렸다. 중앙위는 찬성 31, 반대 8표로 안건을 처리했다.
해고자들은 노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1월 24일 성명을 내고 “희생자구제기금 중단과 제한 결정은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희생자에게 희생자구제기금은 생계비다. 노조에서 생계비를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건 희생자를 노조가 또다시 해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해고자 생계를 노조가 지원하는 것은 민주노조라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노동당 역시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지원 중단 및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며 “해고자들의 당면 과제는 복직 투쟁이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조가 지원을 제한한 것은 민주노조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해고자들의 투쟁 동력을 끊는 행위”라고 전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조직적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광범위한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해고자들의 행동이 복직 투쟁에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희생자들은 조직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이는 조직 규율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를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중집과 중앙위의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