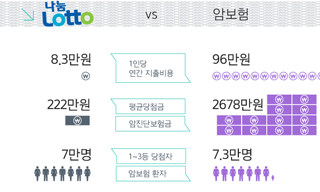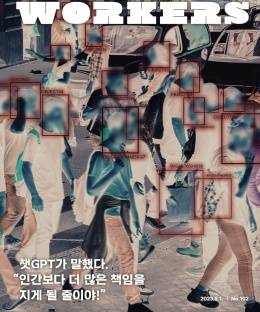사망한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 하청업체와 계약한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다. 고인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석탄을 운반하는 2t짜리 스크류 기계에 깔려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발전소 제 1부두 석탄 하역기용 컨베이어 스크류 반출정비 공사를 위해 해당 설비를 2단으로 적재해 로프로 결박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발생했다. 이후 고인은 119구급차량으로 태안군보건의원에 이송된 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해 닥터헬기를 이용하여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다.
 |
원청인 서부발전은 반출정비 업무를 신흥기공이라는 업체에 발주했고, 또 이 협력업체는 해당 설비 반출 업무를 고인에게 맡겼다. 화물 상차 업무는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수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 복잡한 고용구조가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은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의 대명사,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는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조차 완료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역시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체 산재 노동자 271명 중 98%(265명)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특히 노조는 고인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않고 보건의원을 거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송 시간을 줄여 고인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중 ‘산업안전 보건의의 위촉·의료체계 확립’ 부분에서 “상주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발전소에 부속 의원을 설치하고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배치하고 발전사 및 협력사의 산업 보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며 발전소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용균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독자인 서부발전이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단은 “스크류가 떨어질 위험, 여러 개를 겹쳐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길 문제 등을 점검해 조치할 의무는 서부발전에 있다”며 “최소한 크레인을 배치해 들어 올린 스크류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현장을 꼬집으며 “컨베이어벨트에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류를 혼자서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 등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도 노조 및 단체들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자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촉구에 입을 모았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이 속해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도 11일 성명을 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원청과 하청업체 책임자 14명이 기소됐으나,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이들은 위험을 계속 방치하며 안전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사업자 등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그사이에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