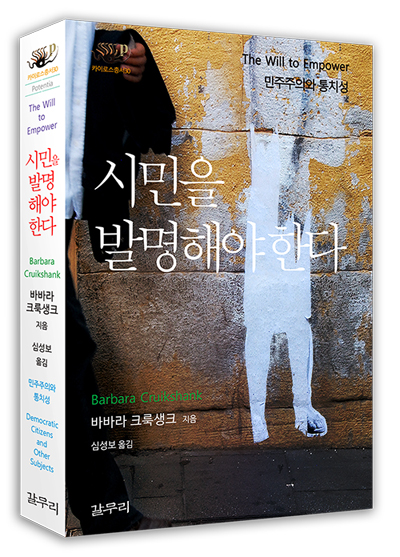 |
 |
그러므로 자유주의 체제는 민주적 개인의 ‘자유’가 확대될 경우 ‘지배’의 영역이 축소되는 문제를 스스로 통치하는 시민을 창출하여, 푸코의 용어를 빌리자면 생명권력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을 결합하여 해결한다. 시민은 자신의 이해관심을 전체 사회의 이해관심과 ‘자발적으로’ 일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가 통치성을 “품행의 지도(conduct of conduct)”로 규정했던 것처럼 시민들은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 예속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창출되며, 지식에 의해 대상으로 규정된 인간이 자신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권력이 된다. 크룩생크는 이러한 시민을 창출하는 테크닉을 시민성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며 시민권 투쟁, 자선활동의 자조계획, 자부심 각성운동 등에서 강조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야말로 바로 시민성 테크놀로지의 핵심 논리이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빈민정책에서 수급자들은 자율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예속된 존재인가? ‘시민/주체’의 논리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양자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어야 하지만 복지 수급자들은 권력에 의해 배제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형성되고 능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를 전제할 때 묵종과 저항 역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체를 주체화/예속으로, 혹은 크룩생크의 표현에 따르자면 시민/(예속)주체로 분할하여 후자를 전자로 전환하려는 비판적 정치기획들은 결국 시민성 테크놀로지와 동형적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이로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제기한 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참여 만능주의가 환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언제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달리 말하자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기획이 앞서 설명한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반-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의 기획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크룩생크는 시민/주체가 불안정하고 경합적이며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권력이 편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혹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분리되지 않으며 자발적 결사, 개혁 운동,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같이 시민이 형성되는 일상적인 미시적 층위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축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이 정치적인 것 자체 혹은 정치의 행위 영역을 변형시킨다는 것을, 정치적인 것의 사회적 변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의 원인을 시민성의 결핍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의 층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민을 구성하는 임파워 의지, 시민성 테크놀로지, 통치술을 연구하여 새로운 유형의 시민을 보다 민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크룩생크는 마지막 장 “복지의 여왕”에서 복지 수급자 여성들을 사기나 조작을 통해 세금을 과도하게 뜯어먹는 집단으로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적 표현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대해 복지권의 옹호자와 단체들(<전국복지권기구>)은 복지를 공격하는 정치인들의 비합리성을 공개하여 “진정한” 사기꾼의 실체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이 쟁점을 “공적”이고 “정치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크룩생크 는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복지의 규정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폭로’가 아닌 다른 전략, 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배타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이를테면 “수급자답게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위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과 분리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붕괴되었다는 분석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배타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저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시민을 “보다 민주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복지권 단체들의 전략을 효과적이지 않다고 기각해버리는 것은 크룩생크가 누누이 주장한 것처럼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혼종된 상태를 분석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을 아예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정치에 대한 분석을 권력에 대한 분석으로 혹은 사회적 삶에 대한 통치의 분석으로 치환하는 시도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 완전히 환원된다면 사적 영역의 이슈들은 공적으로 논의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적 특성이 강화된 양상으로 재확인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 우리는 개인적으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맞서고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