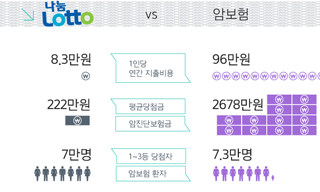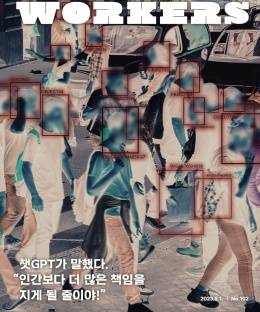그러나 '국군의 해외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 위반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외교부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평화유지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는 "헌법정신과도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60조 2항의) 기본취지는 파병으로 인해 외국과 외교적 마찰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고, 역할이 제한된 만큼 "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거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개연성이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실제 우리나라는 PKO 파견 이후 충돌에 의해 희생자가 생긴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절차 길어져 파병지연 된 적 없어"
법제정 추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수년에 걸쳐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파병 동의를) 그때그때 받는 것이 그렇다"며 번거로움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러나 PKO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를 간소화 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국회 절차가 10일 전후 밖에 되지 않고 절차가 길어서 평화유지군(PKO) 파병이 지연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을 개연성이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UNIFIL(레바논유엔평화유지군)에서도 스페인 PKO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PKO파병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법안은 정부가 개발공적원조와 함께 평화유지군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유지군 파병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지난 17대 국회에서 김무성 의원도 평화유지군 파병을 손쉽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93년부터 평화유지군 파병 잇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9월 유엔의 정식 회원국되면서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대상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1992년 9월 유엔의 요청에 따라 93년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차원의 해외파병이 본격화됐다. (아래 표)
 |
한국은 지난 2006년에도 동티모르와 그루지아,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서부 사하라 등 5군데서 UN평화유지군으로 참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